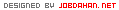887
-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0||0밥그릇계산에 따른 권위의식!
이것 또한 극복해야 할 요소가 아닐까요?
어느 대학생이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인용해 봅니다.
제목하여
'케케묵은 밥그릇 계산'
경향신문 2008년 10월 2일(목) 오피니언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고자 : 이응소(대학생)
한국교회 최초의 최연소 집사가 탄생되는 시점에서 향후 발언권 및 원활한 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초석 다지기는 결코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초·중·고교를 다니며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1~2년 선배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9월생으로, 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와는 반말을 하면서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존댓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의 끈질긴 설득에도 결코 말을 놓지 않던 1년 후배가 있었다. 내가 1년이 무슨 대수냐고 하자 후배가 대답했다. ‘1년이면 밥그릇이 몇 갠데요.’
그때 내가 3×365그릇의 밥을 더 먹었다는 이유로 존댓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몹시 당황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군대식 발상이었다. 하루라도 먼저 입대한 사람이 고참 대우를 받는다는 군대. 군대에서의 경어 사용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처음 온 ‘놈’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온 ‘놈’이 총을 더 잘 쏠 테고, 전시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워 싸울 줄 아는 사람의 말을 ‘철저히’ 들어야 하니, 이 위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반말과 존댓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어느 선배에게 “내가 왜 당신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그 선배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연륜이 쌓여 거기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07학번 K는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고생을 하며 컸고 그런 경험에서 자란 생각들로 사회과학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 생각이 무르익어 있는데, 03학번 L은 점수 맞춰 과를 선택해 1학년 때 술만 마시다 군대 갔다 온 후 여자 연예인 얘기하는 낙으로 살며 토익 책만 파는 경우는 어쩌란 말인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사람의 경험치가 결정되는 것은 군대나 농경사회에서처럼 정보의 폭이 제한된 사회에나 해당되는 일이다. 현대사회의 제도 교육은 실제 한 성원이 스스로 습득하고 확장해 나가는 창조적인 영역들을 뒤따라가는 데 실패했고, 한 사람의 내적 성장은 자기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정보사회의 들판에서 열매를 찾아 따 먹고 사람을 만나 부딪히느냐에 달려 있다. 군대나 농경사회처럼 단계별로 경험치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경험과 연륜이 얼마만큼이고 그래서 얼마나 현명한가는, 나이로 가늠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인차가 더 크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개개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방식에 맡기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묶어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까지만 해도 10년 차이는 벗이었다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토록 위계를 좋아하는 건 그간 이 사회를 지배한 군사문화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는 ‘도덕교육의 파시즘’에서 한국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만 있고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다고 말했다. 내 친구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어느 교수를 학교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더니, 옷매무새를 다듬고 깍듯이 목례를 하고 지나가시더란다. 어느 모임에서는 1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사이좋게 반말을 하지만, 반말 좀 한다고 있는 지혜를 못 배우는 일 없이 잘만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모임의 조언자셨던 80대 할아버지는 20대 젊은이들과 논쟁하면서도 끝까지 존댓말을 쓰셨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배, 허락도 없이 혼자서만 반말하지 말아요. 밥은 내가 더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이것 또한 극복해야 할 요소가 아닐까요?
어느 대학생이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인용해 봅니다.
제목하여
'케케묵은 밥그릇 계산'
경향신문 2008년 10월 2일(목) 오피니언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고자 : 이응소(대학생)
한국교회 최초의 최연소 집사가 탄생되는 시점에서 향후 발언권 및 원활한 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초석 다지기는 결코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초·중·고교를 다니며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1~2년 선배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9월생으로, 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와는 반말을 하면서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존댓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의 끈질긴 설득에도 결코 말을 놓지 않던 1년 후배가 있었다. 내가 1년이 무슨 대수냐고 하자 후배가 대답했다. ‘1년이면 밥그릇이 몇 갠데요.’
그때 내가 3×365그릇의 밥을 더 먹었다는 이유로 존댓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몹시 당황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군대식 발상이었다. 하루라도 먼저 입대한 사람이 고참 대우를 받는다는 군대. 군대에서의 경어 사용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처음 온 ‘놈’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온 ‘놈’이 총을 더 잘 쏠 테고, 전시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워 싸울 줄 아는 사람의 말을 ‘철저히’ 들어야 하니, 이 위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반말과 존댓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어느 선배에게 “내가 왜 당신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그 선배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연륜이 쌓여 거기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07학번 K는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고생을 하며 컸고 그런 경험에서 자란 생각들로 사회과학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 생각이 무르익어 있는데, 03학번 L은 점수 맞춰 과를 선택해 1학년 때 술만 마시다 군대 갔다 온 후 여자 연예인 얘기하는 낙으로 살며 토익 책만 파는 경우는 어쩌란 말인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사람의 경험치가 결정되는 것은 군대나 농경사회에서처럼 정보의 폭이 제한된 사회에나 해당되는 일이다. 현대사회의 제도 교육은 실제 한 성원이 스스로 습득하고 확장해 나가는 창조적인 영역들을 뒤따라가는 데 실패했고, 한 사람의 내적 성장은 자기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정보사회의 들판에서 열매를 찾아 따 먹고 사람을 만나 부딪히느냐에 달려 있다. 군대나 농경사회처럼 단계별로 경험치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경험과 연륜이 얼마만큼이고 그래서 얼마나 현명한가는, 나이로 가늠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인차가 더 크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개개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방식에 맡기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묶어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까지만 해도 10년 차이는 벗이었다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토록 위계를 좋아하는 건 그간 이 사회를 지배한 군사문화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는 ‘도덕교육의 파시즘’에서 한국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만 있고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다고 말했다. 내 친구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어느 교수를 학교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더니, 옷매무새를 다듬고 깍듯이 목례를 하고 지나가시더란다. 어느 모임에서는 1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사이좋게 반말을 하지만, 반말 좀 한다고 있는 지혜를 못 배우는 일 없이 잘만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모임의 조언자셨던 80대 할아버지는 20대 젊은이들과 논쟁하면서도 끝까지 존댓말을 쓰셨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배, 허락도 없이 혼자서만 반말하지 말아요. 밥은 내가 더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 장미 ㅎㅎ
시와 그림님을 사모하는 누군가가 선물한 장미인가 보군요.
행복하시겠어요.
사실 그때 그 질문은 평상시에 고민하는 질문은 아니었고,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막상 입밖에 꺼내놓고 보니 그럴듯한 질문으로 둔갑해 있더군요.
예전 이현주 목사님 책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태양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은(있어 보이는 것은) 태양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고정되게 보이려면
태양또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물리적으로 어느정도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이 변화와 역동의 토대위에서 확보된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시사하는바가 큰 것 같아요.
시와 그림님을 사모하는 누군가가 선물한 장미인가 보군요.
행복하시겠어요.
사실 그때 그 질문은 평상시에 고민하는 질문은 아니었고,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막상 입밖에 꺼내놓고 보니 그럴듯한 질문으로 둔갑해 있더군요.
예전 이현주 목사님 책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태양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은(있어 보이는 것은) 태양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고정되게 보이려면
태양또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물리적으로 어느정도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이 변화와 역동의 토대위에서 확보된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시사하는바가 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