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하늘이 낮게 가라앉은 오후,
해가 지는가 싶더니 금세 어둠이 내립니다.
저는 1층 계단 위 창문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집에 올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본인들이 알아서 대문을 여는 것까지 연습해야 합니다만,
늘 정신을 빼놓고 산다는 엄마는 아침에 열쇠 주는 것을 깜빡하셨다고 합니다.
동생들이 현관으로 들어오네요.
무엇이 신났는지 첫째 동생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네요.
쿨하군요.
둘째 동생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걷고 있네요.
제 동생들이지만 여전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적 장애인 2명을 둔 누나의 입장은 그저 챙피하다..로 압축됩니다.
철이 덜 든 까닭일까요?
예기치 못한 불행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어도
선천적 열등함에 대해서는 그닥 너그럽지 못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동생들이 다니던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야심차게 시작하셨던 공동체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여,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 주간보호센터를 나가고 있구요.
".............여자 친구 왔다!"
"예뻐?"
"예쁘지!"
"이름이 뭐야?"
".............................."
"이름이 뭐야?"
"............................."
"이름도 몰라? 야! 이쁘면 무조건 가서 너 이름이 뭐니? 맘에 든다. 이렇게 해야지."
"아! 깜빡했네"
"내일 물어봐"
"응. 물어봐야지"
여자애가 센터에 온 모양입니다.
제 둘째 동생은 눈이 낮기 때문에 예쁘다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동생에게 물었지요.
"이쁜 애가 왔어?'
"............"
"이뻐?"
"이쁘다"
"이름이 뭐야?"
"......................."
"걔 말 못하니?"
"말 못하지"
"푸하하하하하하하"
엉뚱한 대목에서 웃음이 쏟아집니다.
첫째 동생의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뭐든지 묻는 말에 맞춰서 대답을 하니까요.
크게 웃었는데 신경질이 납니다.
속에서 뭔가 고약한 놈이 치받는 느낌이랄까요?
마침 전화벨이 울리네요.
"사모니임~~ 여긴 케이티 어쩌고 저쩌고"
이 때다 싶습니다.
"도대체 케이티는 고객을 뭘로 보는 겁니까? 하루에 5번도 넘게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다니 이건 거의 폭력 아닙니까!"
언성을 크게 높이고 마치 어린 학생을 혼내듯이 꾹꾹 눌러서 힘있게 발음합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항변을 하기도 전에 다시 퍼붓습니다.
"한 번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전화선을 타고 오는 저쪽의 음성이 흔들리네요.
많이 당황을 한 모양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 뭐냐.. 이게.. 화를 내시니 제가 말까지 더듬는데요.. 저기.. 100번으로 티엠 금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분명합니다.
이럴 땐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좋지요.
"언성 높여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하하하. 근데요.. 진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한두 번은 친절하게 잘 받는데 그 이상은 정말 신경질이 나요. 하하하하.
그치만 전화거신 분도 이게 직업이실텐데 제가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도 이게 직업이지만 진짜.. 광고 전화를 받아보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것에 화를 쏟아부으면 결국 자신이 상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동생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찬양도 불렀다가 먼저 가신 노 대통령이 안 됐다고도 했다가.
청중 없는 연설을 언제쯤 끝낼까요?
아버지가 오시면 끝내겠지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갔군요.
종말론적 삶을 향한 더딘 걸음이 슬슬 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대림절 주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닥 기대되지 않아서 슬픈 은빛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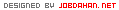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