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꼬마 우디, 별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만 해도 밤마다 봤던 별들이었는데....
청년이 되어서는 별을 볼 수 없는 서울 밤 하늘을 투덜대며 기어이 밤바람을 쐬곤했습니다.
별에 얽힌 이야기 하나 ..."자, 필름 돌아갑니다."
(반응 별 볼일 없거나 억지스런 호응이면 이야기는 눈치껏 하나에서 끝납니다.)
작대기 한개시절, (이등병시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눌하고 무척이나 힘들고 철저히 혼자인 외로움에 몸서리 치며
수없이 어금니를 꽉꽉꽉 깨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질 더러운 고참과 새벽 경계근무를 나갔었지요.
이 고참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 군대에서 사투리 쓰라고 그렸어? 한 번만 걸리면 콱 죽여불텡게!"
자신의 말대로라면 벌써 자살을 했어야할 이 고참이 그 날은 나의 사수였습니다. (사수 : 군인이 짝을 지어 경계근무를 설 때에 고참을 가리킴)
고참 왈, "새꺄, 나 잘텡게 감시 잘혀, 한 번 보겄어."
잔다면서 어떻게 보겄다는 것인지...
그래서 하늘같은 고참은 뒤집어져 자고, 나는 또 혼자였습니다.

땅아, 꺼져라 하면서 조심스레 한숨을 내몰고는 '엄니~' 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옆에 나무를 잡고 흔들면 당장이라도 후두두 떨어질 듯 그렇게 수 많은 별들이 나무가지 사이사이에 달려있던 그 곳, 강원도 홍천!
정말 무슨 소설마냥 유난히 눈에 띄는 별이 꼭 한개 있더군요. 혼자 멀리 떨어져 빛나고 있었던....
나는 쓸데없이 총을 들어 별을 겨누어 보았습니다.
가늠쇠 구멍으로 우리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왠지 죄 짓는 듯한 기분에 곧 총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외로운 처지에 총부리를 대다니...'
그 적막하고 긴 밤, 수십광년의 거리를 우리는 말 없는 대화 속에 수 없이 오가며 어느새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 A, 이런 젠장찌게같은 ... ,
뤼브롱 산에서 양치던 목동이 ★을 쳐다볼 땐 천사같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깨 위로 살포시 머리를 고였다던데
내가 ★ 좀 보려니까 지지리도 분위기 모르는 고참이 잠이 깼습니다, 참 ★ 일입니다.
고참 : 야, 재미난 야그 좀 혀봐.
우디 : 저기 저 ★ 보이십니까..... 어쩌구, 저쩌구, ★★★...
고참 : 이 놈이 참 ★난 놈이네, 그런거 말고 껄쭉한 女, bed, 男 애기 몰러?
우디: 몰라, 이 자식아. 그런 얘기 닳도록 들어서 앞 부분만 들어도 속편에 아류작 스토리까지 줄줄 읊어대는 놈이, 질리지도 않냐?
로맨스는 모르는게 빗나간 섹스만 알아가지고...(차마 속으로만 욕했습니다.)
"어이쿠, 필름이 다 돌아갔네요."
청년 우디는 혹시 그 때 그 별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하늘을 보고 걷다가 마빡만 깨질뻔 했습니다. (마빡이 왜? 해답은 아래에)
쫄따구 시절 그 별을 만난 이후로 나는 이 시를 좋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김광섭 詩
유심초 歌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두움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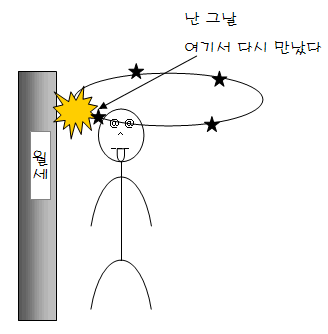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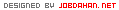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