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如哀反多羅* 1
이성복
추억의 생매장이 있었겠구나
저 나무가 저리도 푸르른 것은,
지금 저 나무의 푸른 잎이
게거품처럼 흘러내리는 것은
추억의 아가리도 울컬울컥
게워 올릴 때가 있다는 것!
아, 푸르게 살아 돌아왔구나,
허옇게 삭은 새끼줄 목에 감고
버팀대에 기대 선 저 나무는
제 뱃속이 온통 콘크리트 굳은
반죽 덩어리라는 것도 모르고
來如哀反多羅 2
바람의 어떤 딸들은
밤의 숯불 위에서 춤추고
오늘 밤 나의 숙제는
바람이 온 길을 돌아가는 것
돌아가면 볼 수 있을까,
바람의 어떤 딸들이
신음하는 어미의 자궁을 열고
피 묻은 나를 번쩍 들어 올릴 때
또 다른 딸들이 깔깔거리며
빛바랜 수의를 마름질하는 것
보다가, 보다가 어미의 삭은
탯줄 끌고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젠가 내가 죽고 없는 세상으로
來如哀反多羅 3
이 순간은 남의 순간이었던가
봄바람은 낡은 베니어판
덜 빠진 못에 걸려 있기도 하고
깊은 숨 들여 마시고 불어도
고운 먼지는 날아가지 않는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눈 감으면 벌건 살코기와
오돌토돌한 간처녑을 먹고 싶은 날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아무래도
나는 남의 순간을 사는 것만 같다
* 來如哀反多羅(래여애반다라)는 이성복 시인의 최근 시집 제목이다. 이 시집에는 이 제목으로 된 시가 아홉 편 실려 있다. 세 편 씩 나눠 싣는다. 이성복 시인의 시는 말 그대로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의 문학적 형상화다. 보기에 아슬 하다못해 아찔하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아찔한 경험은 비슷한 것 같다. 그의 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현묘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일까 슬픔일까, 환희일까 공포일까? 이 세상에서 이미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볼 것이다. 마치 부활 경험이 은폐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듯이.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시집의 발문을 쓴 홍경님 선생의 설명을 조금 빌려오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향가 <풍요(風謠)>(<공덕가(功德歌)>)의 한 구절인 ‘래여애반다라’는 ‘오다, 서럽더라’라고 풀이됩니다. 신라 백성들이 불상을 빚기 위한 흙을 나르면서, 그 공덕으로 세상살이의 서러움을 위안하는 내용이라 알려진 저 오래된 노래. 선생님은 ‘공덕’이 아닌, ‘서러움’에 방점을 두고 ‘래여애반다라(來如哀反多羅)’라는 여섯 글자의 의미를 각각 따로 해석하였습니다.”
통 모르겠어요.
목사님 해설 없었으면
저는 '살풀이 춤'만 연상하다 말 뻔 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현묘세계, 시방세계, 죽음세계 너머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낮의 해 같이 빛나는 세계일까, 아니면
칠흑같이 어둔 밤일까,
환희의 세계일까, 고통의 세계일까,
그러나, 설령, 그 세계가 고통의 세계일지라도
'그 분 안에서, 그 분과 함께' 라면
그 자체를 '환희'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라 하시니,
이런 한시가 생각나네요.
저 백은의 세계 눈부시어
이 누리가 온통 한 진리네
밝음과 어둠마저 이를 수 없는 곳
오후의 햇살에 전신이 드러나네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을 탐닉할까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이 없을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우리의 물음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사도신경의 끝마디는 이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이 지금의 이런 삶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유일회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의 저주이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모순과 딜레마가 가득해도
그것이 바로 삶의 현실이기에 버텨내야 합니다.
비록 어둠이 가득한 무덤 같은 삶일지 몰라도
저쪽에서 비쳐오는 빛을 힐긋이라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삶을 크게 긍정하게 될 겁니다.
그 큰 긍정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순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고유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래여애반다라'- 오다, 서럽더라.
인간실존의 깊이를 보면 서럽지요.
그 서러운 실존을 받아들일줄 알면
새로운 차원의 기쁨에 사로잡히겠지요.
이 극치의 오묘한 삶을
우리가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이게 기억날까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 새하늘과 새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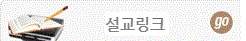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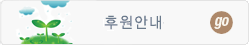










시에서 풍기는 느낌이 이갑철 선생님의 사진집 충돌과 반동과 비슷하네요.사진집에는 더욱 좋은(?) 사진이 많지만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에 그나마 자유로운(배포한 것처럼 보이는)
공개된 사진 몇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