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동양철학 박사 도올 김용옥 교수의 시각으로부터의 통찰
<결론>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 Logos적 '基督論']을 형성시킨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
<이해 방식/과정>
-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창조주이신 신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리라.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참고문 있는 곳 :
http://kr.blog.yahoo.com/yydeokk196/MYBLOG/dist_frame.html?d=
http%3A%2F%2Fkr.blog.yahoo.com%2Fyydeokk196%2F12943%3Fm%3Dc%26amp%3Bno%3D12943&s=d
* 참고문 주요 내용 중 의문점으로 남는 사항 ;
'원죄론은 (예수의 사상과는 상관없는) 단지 사도 바울의 신한적 견해이다.'
-----------------------------------------------------------------------------
김용옥씨 학력(위키백과 소개내용)
- 1953년 4월~1959년 3월 천안제3국민학교 졸업
- 1959년 4월~1965년 2월 보성중·고등학교 졸업 (55회)
- 1965년 3월~1967년 2월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생물학과
- 1967년 3월~1968년 2월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
- 1968년 3월~1972년 2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문학사, 「버트란드 럿셀의 논리원자주의」)
- 1972년 3월~1972년 8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 1972년 9월~1974년 6월 대만 국립대만대학 철학연구소 (철학석사, 「노자 "자연" 철학중 "무위" 지공능(老子「自然」哲學中「無爲」之功能)」)
- 1974년 9월~1975년 3월 일본 도쿄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과 연구생
- 1975년 4월~1977년 2월 일본 도쿄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과 (철학석사, 「왕선산의 동론(王船山の動論)」)
- 1977년 2월~1977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동방학과 대학원
- 1977년 9월~1982년 6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철학박사, 「왕부지의 철학, The Philosophy of Wang Fu-chich(1616~1692)」)
사실 굳이 따지고 들자면, 교리 체계로써의 원죄 개념은 어거스틴에서 찾는 게 맞겠죠.(...어거스틴 맞죠?ㅠ) 로마서 본문도 해석에 따라 대속-원죄 개념인가, 아니면 죽음의 '연대'로써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인가...도 고민할 부분이지요. 도올 영감님이야 글은 재미있게 쓰시는데, 보다 더 자세한 지점까지(그 개념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고민'들)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신학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이겠지요.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은 인정하구요.
많이 아쉬운 것은 방대한 in-put 이
그의 하드에서는 특정 에러를 발생시키는 지
out-put 으로 영 딴 것이 나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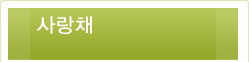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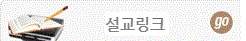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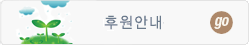






서구권 철학과에는 서양철학 위주로 커리가 되어 있지요.
과목도 동양쪽 과목은 지역학이나 종교학과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김용옥 선생은 하버드 철학과 출신 Ph. D.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학과의 Ph. .D 이지요.
Ph. D. 학위는 해당 전공의 전문 박사 타이틀일 뿐이지.
철학과의 박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철학과 박사가 아니라
중국지역학 과의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서양 친구들이 철학이라는 분과학문을 자신들의 고유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커리 편재상 철학과에 동아시아 철학으로 전공할 수 없기에 생겨난 일이긴 하지요.
참고로 제가 나온 독일 Marburg대학교 철학부에도 동양철학은 없습니다.
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동서비교 철학 정도인데
비교 철학 분야 자체가 철학분야에서는 워낙 비주류인지라
1년에 한번 개설될까 말까입니다.
반면 제 전공쪽인 종교학에서는 그쪽 분야 수업이 많이 개설됩니다.
주로 지역 경제나 지리 쪽에 치중한 지역학에 비해
종교학쪽에서는 종교, 문화, 사상, 철학에 대한 접근이 활발한 편이지요.
뭐 한국에서야 그런 세부적인 서구권의 전공 커리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적으니
그냥 간판 하나가 더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겠죠.
워낙 그런 것이 익숙해진 사회이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