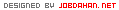- Classic Style
- Zine Style
- Gallery Style
- Studio Style
- Blog Style
구독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책과 생각>의 한 꼭지를 읽고 머리 속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펌> 내용으로 교우들과 잠시 같이 생각에 잠기도록.....
| 홀로코스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조선 | |
 |
|
<SCRIPT src="/section-homepage/news/06/news_font.js" type=text/javascript></SCRIPT>
<STYLE type=text/css>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STYLE>
디아스포라의 눈 / 조선 민족의 시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어와 있을까? 자신이 경험한 점령의 고통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타자에 대한 둔감성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둔감성에서 기인한다.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식민지 시대의 진실을 덮어 감추려는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 논리에 결여돼 있는 것은 “점령이란 치욕이며 인간성의 파괴”라는 관점이다.
지난번 이 칼럼에서 사라 로이 교수의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글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면 관계로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다. 로이 교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이다. 폴란드의 게토와 수용소에서 이 여교수의 가족과 친족 1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그의 부친은 헤움노 절멸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어머니와 이모는 게토와 수용소에 7년간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외가 쪽에서 전쟁 뒤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명에 갔다. 모친이 이스라엘 이주에 반대한 이유는 “인간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간다면 관용과 공감과 정의는 결코 실천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자란 로이 교수는 성장 과정에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찾아갔다. 그곳은 아이의 눈에는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평화로운 곳처럼 여겨졌으나 이윽고 그는 거기서 홀로코스트가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국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이 그가 그 지역 연구자를 지망하는 계기가 됐다. 1985년 여름,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그는 그때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어느 날 그가 길에 서 있는데 팔레스타인 노인과 그 사람 손자가 당나귀를 끌고 지나갔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노인에게 다가갔고 그들 중 한 명이 당나귀 입을 억지로 벌려 보고는 말했다. “이런, 당나귀 이빨이 누렇군. 제대로 이빨을 닦아주고 있는 거야?” 우롱당한 노인이 입을 다물고 있자 병사는 화를 내며 고함을 질러댔다. 다른 병사들은 그것을 즐기며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입을 다문 채 계속 서 있었고 손자는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병사는 노인에게 명령했다. “당나귀 엉덩이에 키스해”라고. 노인은 처음엔 거부했으나 병사가 고함을 지르고 손자가 울어대자 말없이 병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 병사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로이 교수는 양친이 자신에게 해준 몇 가지 일화를 떠올렸다고 한다. 칫솔로 사람 다니는 길을 닦도록 강제당한 일, 대중의 면전에서 턱수염을 깎인 일 등 1930년대 유대인들이 나치한테서 당한 수모들이었다. “그 늙은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은 그 원리나 의도, 충격에서 그런 수모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로이 교수는 깨달았다. 그 뒤 그는 똑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걸 목격했다. “점령이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박탈당하는 걸 말한다. 그들의 재산이 파괴당하고 그들의 혼이 파괴당하는 일이다. 점령이 노리는 핵심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결정할 권리,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점령이란 치욕이며 절망이다. …무서운 자폭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바로 이 박탈과 질식이라는 맥락 위에서다. …자폭자도 처음부터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이 교수의 이런 사상은 유대인의 경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험을 국가가 바라고 있듯이 대립시켜 놓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난의 경험으로 파악함으로써 양자를 이어주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내게 홀로코스트의 교훈이란 항상 특수한 (유대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 이 칼럼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그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를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유대인이 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사실에 반한다”고 쓴 것은, 홀로코스트 경험을 타자와의 연대 논리로 발전시키려는 로이 교수와 같은 유대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 세상을 떠난 팔레스타인 사상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2000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래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점령은)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긴 식민지배·군사점령입니다. 그 이전에 최장이었던 것은 1910년부터 1945년에 걸친 일본의 조선반도 점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은 마침내 최장기록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문화와 저항>) 사이드의 시야에는 조선이 들어와 있었다. 사이드가 일제 점령하의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상세한 내용까지 알진 못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배와 점령이라는 것의 본질을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점령의 고난을 경험한 조선 민족을 시야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 민족의 시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어와 있을까? 사이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점령의 고통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타자에 대한 상상과 공감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을까?
서경식/ 도쿄경제대학 교수 번역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